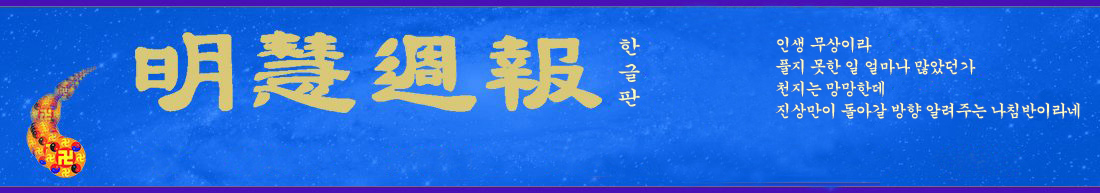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법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배려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하죠. 독선이나 오만 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자만할 수 있는데, 수련자로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날 선 주장을 듣고, 적지 않은 압력을 버티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법관. 서울행정법원 김송(41)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마음가짐을 파룬궁을 수련함으로써 얻고 있다.
“원고나 피고가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법관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태도를 함양하는 데 수련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억울한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알아보려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 수련으로 심성을 높이면서 가능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특별한 아내
수련은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큰 버팀목이 됐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이는 그녀의 인내심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가끔 불같이 화내는 남편에게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참았기 때문이다. 갈등 속에서 참아내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닮았다.
“한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싸울 때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원망하지 않고 참았더니 그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신기했습니다.”
묵묵히 참아주며 자신만의 확고한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두고, 남편은 “내가 전생에 나라를 10번 정도 구한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특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 수련생들이 제작한 삼자경이나 제자규 등 전통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도덕이 내면화되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단속하는 걸 배우게 된다.”라고 말했다.
물리학도의 깨달음
김송 판사가 처음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건 20년 전, 카이스트 물리학도 시절인 20대 초반이었다. 늘 고민해오던 학문의 한계를 명백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고민 없이 수련을 시작하게 됐다.
“물리학은 퍼즐을 굉장히 힘겹게 하나하나 맞추는 거였어요. 우주 물리에서도 정교한 고난도 수학으로 조각을 맞추지만, 우주의 극히 일부 같았죠. 파룬궁 수련서인 ‘전법륜(轉法輪)’을 읽는 순간, 공부해오던 분야가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몰랐던 부분까지 명백해졌어요.”
수련으로 심성을 승화시키는 것은 경쟁 사회 속에서 물든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던 그녀의 소원과도 맞닿았다.
“대법을 접하고 나서 든 생각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 한 부분까지도 모든 게 이타적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니, 이건 제가 찾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수련을 한 후로는 특별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시시비비 속에서 사익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던 데로부터 서서히 알게 됐기 때문이다.
“수련하기 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늘 분투해야 하고,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이따금 절에 가서 울다 오기도 했고요. 수련한 후로는 마음속에 진·선·인(真·善·忍)이 있으니 삶의 등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고 세상의 타락한 기준으로 자신을 맞추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김송 판사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아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가 둘이 있고, 바쁜 일상에 치어 살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의 관점에서 지금은 무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