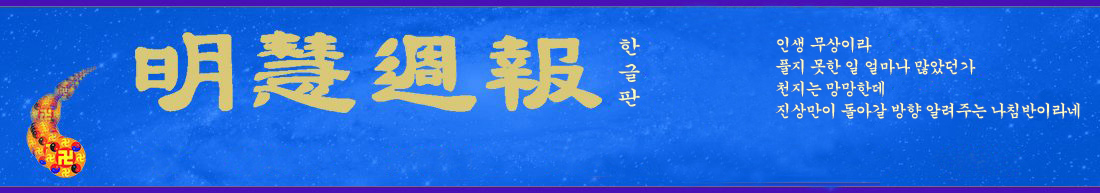공자는 살인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글로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 죽이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기로 죽이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해로운 것이 글이고, 다음은 말이며, 마지막이 무기다. 공자가 말한 살인은 육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 거짓말과 그릇된 설을 퍼뜨려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게 하고 악업을 짓게 함으로써 그들을 망쳐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청대 저명 학자 기효람(紀曉嵐)은 ‘열미초당(閱微草堂)’ 14권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복건(福建)에 사는 구이전(邱二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 다리를 건너다가 큰비를 만난 한 행인이 비막이 우산 안에서 비를 피했다. 잠시 후 그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는 관리 같은 사람과, 족쇄와 수갑을 찬 죄수들을 붙잡고 있는 하급 관리 몇 명을 어렴풋이 봤다. 그는 관청에서 죄수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 감히 소리 내지 못하고 구석으로 비켜서 그들의 동정을 살펴봤다.
갑자기 한 죄수가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자, 그 관리가 호통을 쳤다. “이제 와서 두려움을 알고 울어본들 무슨 소용 있는가! 생전에 왜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 죄수가 말했다. “소인은 제 스승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늘 신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인과응보란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라며 질책했습니다. 저는 이런 스승의 말을 들은 지 오래되어 곧이곧대로 믿게 됐고, 살면서 온갖 계략으로 남들을 해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자신을 이롭게 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응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영예와 치욕의 구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해 더욱 제멋대로 굴었는데 죽자마자 지옥에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이 죄수가 울며불며 하소연한 후 또 다른 죄수가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당신은 스승에게 속았군요. 저는 무당에게 속았습니다. 그 무당이 말했지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향 피우고 베풀면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악업도 없앨 수 있다네.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무당에게 독경(讀經)을 청하면 초도(超度)할 수 있다네.’ 그래서 저는 먼저 돈을 좀 더 챙기고 나서 그 돈으로 향을 피우고 베풀며, 죽은 후에는 가족들에게 무당을 청해 독경하고 초도하게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사람의 선악과 사심(私心)의 크기로만 죄와 복을 정하실 뿐, 재물을 바치는 것은 전혀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승에 와서야 사심 때문에 지은 죄업을 전부 갚아야 하고 하나도 빠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구이전은 이들의 대화를 들은 뒤에야 지금 염라대왕이 죄수들을 심문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거짓말에 속아 나쁜 일을 해도 죗값을 치러야 하는구나! 저승에서는 사람 마음의 선악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죄를 정하니 그릇된 설은 정말 사람을 해치는구나!’
‘하늘을 따르는 자는 번창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한다(順天者昌, 逆天者亡)’라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온다.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의 명리(名利) 속에서 오로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고 하늘의 도에 순응하고 따르며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생존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글/ 리유이(李柔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