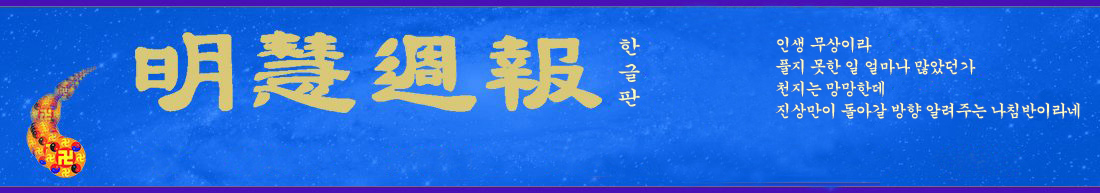우리의 유구한 문명역사 속에서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대대로 전해져 온 미덕이었다. 고대인들은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도를 중시했으며 품행을 수양해 후대인들의 모범이 되었다. 안회(顔回)가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안회는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수제자였다. 그는 공자를 깊이 존경했으며 공자의 사상과 학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평생 힘써 스승의 가르침을 행해 덕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안회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자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지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시 노나라 대부 소정묘(少正卯)가 공자와 동시에 학문을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빼앗아갔다. 소정묘는 군중 심리에 영합해 삿된 설을 퍼트렸고, 학생들도 큰 영향을 받아 공문(孔門)이 세 번 가득 찼다가 세 번 텅 비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직 안회만은 단 한 번도 공자 옆을 떠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왜 소정묘를 찾아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자 안회가 대답했다. “하루를 스승으로 모셨다 해도 평생 부모님과 같습니다. 또 스승님의 학술은 천명을 따르고 인덕(仁德)을 주창하며 사람들에게 정도(正道)를 알려주시는 것이므로 족히 배울 만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안회는 아주 고생스럽게 공부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詩)와 예(禮)를 배우고 학업에 정진했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복습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다.” 공자도 안회를 칭찬하여 “안회는 정말 대단하구나. 끼니마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마시며 초라한 집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간고함을 참아내며 추호도 자신의 원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했다.
안회는 공자가 제창한 ‘인(仁)’의 함의를 참답게 깨닫고 착실하게 몸소 실천했다. 그는 사람을 대함에 겸손했고 “화가 나도 남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았다.” 공자가 그에게 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남이 나를 선하게 대해도 그를 선하게 대하며 남이 나를 선하지 않게 대해도 역시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공자가 칭찬하며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이 넘도록 인을 어기지 않으나 그 나머지 사람은 하루나 한 달 안에 이를 뿐이다.”
일찍이 공자가 먹을 것이 없어 아주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다. 어떤 제자들은 이를 두고 의론하기 시작했으며 동요가 생겼다. 하지만 안회만은 편안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물을 뜯어다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는 나물을 공자의 문앞에 가져다 놓아 스승에 대한 존경과 스승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는 “스승님의 도는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하셨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께서는 전심전력으로 추진하시며 인덕(仁德)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비록 굶주림의 재앙을 만나고 일부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다 하여 스승님의 도에 무슨 상처가 되겠는가? 이는 어쩌면 바로 도(道)가 진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정도(正道)를 지키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도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치욕이다. 우리가 정도를 전파함에도 일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치욕이다.”라고 말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안회에게 이런 식견이 있다니 아주 훌륭하구나! 영지와 난초는 깊은 숲속에서 자라지만 사람이 없다고 하여 향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니며, 군자가 도를 닦고 덕을 세움에 곤궁하다고 하여 절개를 바꾸진 않는다.” 안회가 어려움에 처해서도 그 덕을 잃지 않고 공자를 따라 천하에 의를 행한 정신은 사람들을 탄복하게 한다. 이때부터 ‘나물을 가져다 놓음’을 뜻하는 석채(釋菜)는 스승을 존경하는 예의를 상징하게 됐다.
글/ 즈전(智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