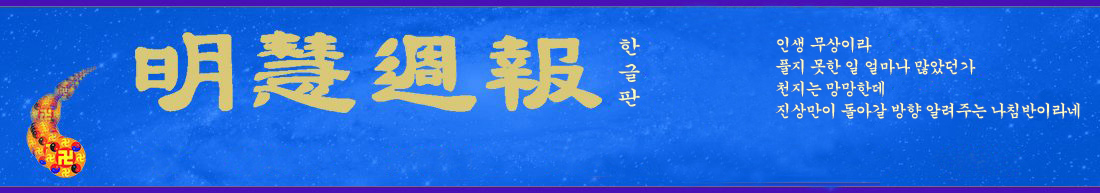천여 년 전, 당 현종 개원 시기의 재상 장설(張說)은 70세 때 200여 자로 된 ‘전본초(錢本草)’라는 문장에서 ‘돈’의 이치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금전(金錢)을 약재에 비유하면서 “달콤하고, 뜨겁고, 독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전은 먹는 음식이자 입는 옷이며 비바람을 막는 집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어,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지만, 성질이 ‘뜨겁기에’ 매혹되기 쉽고, 그것을 위해 미치고 돈벌이에 열중하기에 중독될 수 있으며, 심한 자는 그것을 위해 죽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전’이라는 이 약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보배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1. 도(道): 쌓이고 흩어지다
2천여 년 전 범려(範蠡)라는 기인이 있었다. 그는 20여 년간 월나라 왕 구천(勾踐)을 도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한 후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빈손으로 떠나 제나라로 갔다.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나의 재능은 반드시 쓸모 있을 것이니, 천금(千金)을 다 소진한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한 이백의 시는 바로 범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의 눈에 높은 벼슬과 많은 녹봉, 많은 재산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몸 밖의 물건이었다. 잃어야만 얻을 수 있다.
조선 중기 무역 상인 임상옥은 생전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나라에 기증했다. 돈 자체는 유통에 쓰는 것이고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에게서 온 것으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물처럼 흐르며 반복해 순환해야 끊임없이 생장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2. 덕(德): 돈을 보물로 여기지 않다
광릉(廣陵) 강양(江陽) 출신인 이각(李珏)은 단정하고 신중했다. 15세 때 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이각에게 식량 판매를 맡겨 돌보게 하자, 이각은 되를 그 사람에게 주어 스스로 측정하게 했다.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에 따른 당시 곡식 시세에 따라 받지 않았고, 곡식 한 되에 2문(1냥=1000문)의 이익만 남겨 부모를 부양했다. 여러 해가 지나 그의 집은 도리어 의복과 음식이 풍족해졌다. 이각은 80여 세까지 직업을 바꾸지 않았고, 백 세가 넘어도 몸이 매우 가볍고 건강했다. 그는 갑자기 자손에게 말했다. “내가 살면서 수년간 자신의 진기(眞氣)를 수양했는데 너희들에게도 좋은 점이 없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죽었는데 3일 후 관이 터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 그는 옷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와 신체가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
3. 의(義): 적절함을 선택하다
명나라 중기, 평소 인품이 단정하고 정직한 주(周) 서생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가난해 셋집에서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부엌의 벽돌 아래에서 은원보(銀元寶) 2개를 발견해 매우 기뻐했다. 주 서생이 말했다. “이것은 불의지재(不義之財)인데 어찌 가질 수 있겠는가?” 그 후 붓을 들어 은자 위에 “이게 내 재산이라면 명확하게 내게 주시오.”라고 썼다. 다 쓰고 나서 주 서생은 원보를 소매에 넣고 집을 나서 나룻배를 탔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원보를 물에 던지고 집에 돌아왔다. 원보를 던지는 것을 본 뱃사공은 어부에게 건지게 했고, 어부는 원보를 건진 후 다른 곳에 숨긴 뒤 거짓말로 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뱃사공과 어부는 싸우다 관청에 불려갔고, 원보 위에 글자가 있는 것을 본 태수는 국고에 넣었다. 그해 가을 주 서생은 향시(鄉試)에서 급제했고, 태수가 베푼 연회에 참석해 은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글자를 써 놓은 은이었다. 주 서생은 진사(進士)에 합격했다.
4. 예(禮):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에 욕심내지 않다
강서(江西)성 무주(撫州) 출신인 청나라의 유명한 의로운 사업가 사정은(謝廷恩)은 사람들로부터 ‘서(西) 어르신’이라 불렸다. 사정은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빈곤했다. 16살부터 사천(四川), 복건(福建), 광동(廣東)에서 장사했다. 한번은 복건에서 장사할 때 모시를 구매한 상인이 돈을 지급한 후 바로 떠났다. 사정은이 돈을 세어보니 물건값의 절반을 더 받은 것이었다. 주변 사람이 그에게 주머니에 넣으라고 했지만 사정은은 그가 비단가게 주인인 것을 알고 도시의 비단가게를 하나씩 찾아다녀서 마침내 이 고객을 찾았다. 사정은이 그가 더 낸 돈을 돌려주니 고객은 사정은의 정직함에 감탄했고 둘은 친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복건성 현지에 널리 전해졌다. 이 고객은 단골손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내 다른 사장에게도 사정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소개했다. 나중에 사정은의 장사는 점점 흥성하여 20년도 되지 않아 복건 지역의 갑부가 되었다. 옛사람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덕을 쌓는 게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더러 자손에게도 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
5. 인(仁): 선행을 좋아하다
청나라 말 홍정상인(紅頂商人-관직과 상인을 겸한 자) 호설암(胡雪岩)이 어느 날 가게에서 몇몇 분점 지배인과 장사에 관한 일을 상의하는데 갑자기 한 상인이 그를 만나러 왔다. 상인은 초조한 기색이었고, 최근 장사에 실패해 급전이 필요해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을 팔겠다고 했다. 사정을 알게 된 호설암은 각 분점에 급히 대량의 은화를 조달하게 하고, 시장 가격으로 상인의 자산을 사겠다고 했다. 주위에서 의아해하자 호설암은 “상인의 가업은 몇 대를 걸쳐 축적된 것일지 모르는데, 그가 제시한 가격으로 사면 당연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어려운 처지를 바꿀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고 친구를 사귈 수도 있으며 양심에도 떳떳하다. 누구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 비를 가려줄 수 있으면 가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6. 신(信):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다
‘사기·계포난포열전(史記·季布欒布列傳)’에 서한(西漢) 초년 계포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정직하고 사람 돕기를 좋아했다. 특히 신의(信義)를 중히 여겼다. 약속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 했기에 평판이 매우 좋았다. 속담에 “천금을 얻는 것보다 계포의 승낙을 한 번 받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일낙천금(一諾千金)’의 기원이다. 나중에 계포는 항우를 따라 패전해 유방의 수배를 받았다. 적잖은 이가 그를 보호해 그는 안전하게 난관을 넘었다. 마지막에 계포의 성실함은 한(漢)왕조의 중용을 받았다.
한번은 범려가 영업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한 부호에게서 10만 전(錢)을 빌렸다. 1년 후 부호는 차용증을 가지고 빚을 받으러 가는 길에 보따리를 강에 떨어뜨려 차용증과 노자를 모두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범려를 찾아갔다. 차용증이 없었지만 범려는 이자를 쳐서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노자까지 주었다. 범려의 자애로움과 성실함은 천하에 널리 알려져 뒷날 상업 활동 중에서 많은 부호가 자발적으로 돈을 가져다주어 범려를 도와 재정 위기를 넘겼다.
사람은 신용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발붙일 수 없다. 옛사람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켰으며, 겉과 속이 같고 언행이 일치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7. 지(智): 돈 때문에 도의를 손상하지 않다
진목공(秦穆公)은 맹맹(孟盟)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정나라를 기습하게 했다. 맹맹은 주나라 동부 경계에서 정나라 상인 현고를 만났다. 현고는 파트너 건숙(蹇叔)에게 “우리가 오늘 그들에게 정나라가 벌써 방비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그들은 감히 더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고 등은 정나라 명령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12마리 소로 진나라 군사를 위로했다. 진나라 군사 맹맹 등 장군 3명은 정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진나라 군인을 위로한 것을 보고는 상대방이 벌써 방비가 있는 줄로 여겨, 병사를 거느리고 진나라로 철수했다. 정목공(鄭穆公)은 현고가 대공을 세운 것을 보고 현고를 크게 포상하려 했지만, 현고는 자신이 타인을 속여 나라의 보상을 받는다면 정나라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상을 거절했다. 현고는 본인이 사기 수단으로 정나라에 좋은 일을 한 것을 권장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장려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여겼다.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권장하면 나라의 풍속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고는 주도면밀하고 생각이 원대했기에 돈 때문에 도의를 손상하지 않았다. /루즈(茹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