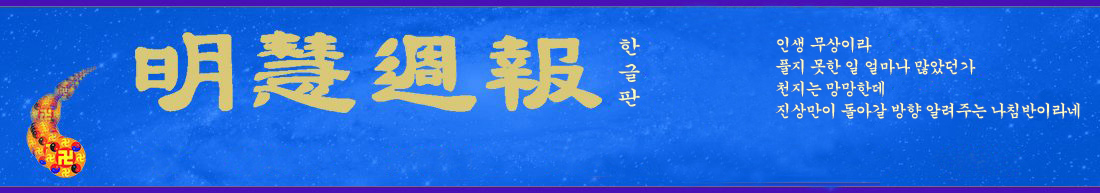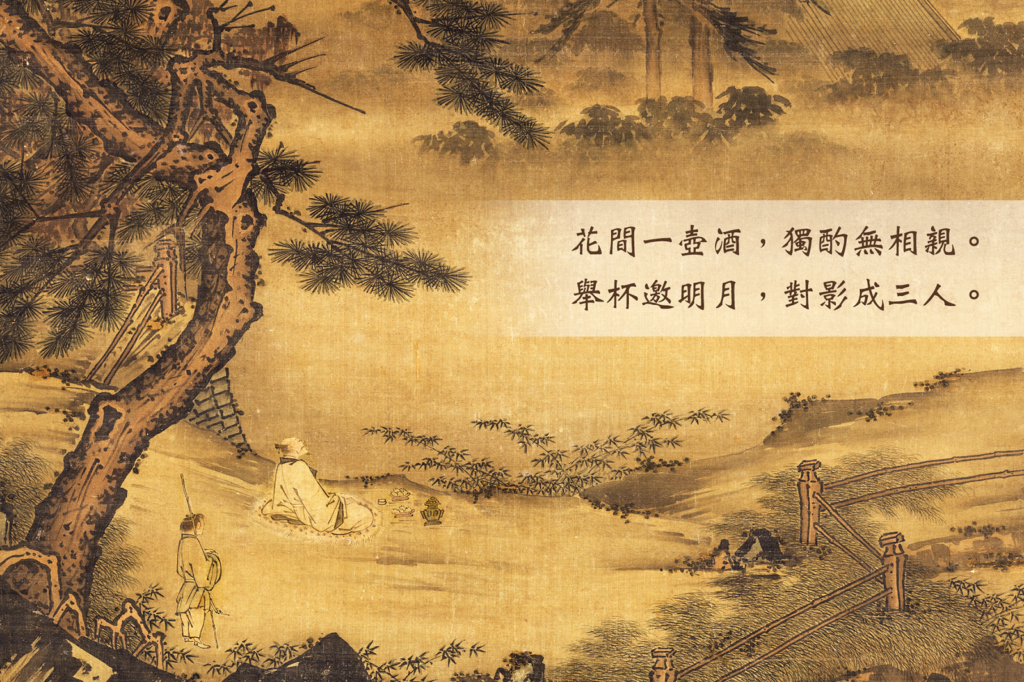
이백(李白)은 701년(무측천 장안 원년)에 태어났으며 자는 태백(太白)이고 호는 청련거사(青蓮居士)다. 사람들은 그를 시선(詩仙) 또는 시적선(詩謫仙)이라 부른다. 조상의 본적은 농서(隴西) 성기(成紀, 지금의 감숙성 천수현 부근)이고 조상 때부터 서역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이백이 중앙아시아 쇄엽성(서돌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부친이 촉(蜀) 땅으로 이주해 사천(四川) 면주(綿州) 창륭현(昌隆縣) 청련향(淸蓮鄕, 지금의 사천성 면현 북쪽)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백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자를 연습했으며 다섯 살 때 이미 초인적이며 천부적인 자질을 드러냈다.
그는 《상안주배장사서(上安州裴長史書)–안주 배 장사님께 드리는 글》에서 “다섯 살 때 육갑을 다 외웠고 열 살 때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했으며(五歲誦六甲, 十歲觀百家)”, “늘 경서를 두루 읽고 창작에 나태하지 않았다(常橫經籍書, 制作不倦)”라고 했다.
또 “15세 때 기이한 책들을 읽었고 부(賦)를 지으면 사마상여를 능가했다(十五觀奇書, 作賦淩相如)”라고 했다. 여기서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전한 무제 시기 촉 출신의 뛰어난 문장가로 특히 부(賦)를 잘 지어 후대에 부성(賦聖, 부의 성인이란 뜻)으로 불린다.
이백은 또 “15세에 검술을 좋아해 두루 제후들의 천거를 구했네(十五好劍術, 遍幹諸侯)”라고 했다.(《한형주에게 드리는 편지(與韓荊州書)》) 여기서 제후란 지방 장관들을 말하는데 지방관의 임무 중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백은 또 “15세에 신선과 노닐며 선유를 쉰 적이 없다네(十五遊神仙, 仙遊未曾歇)”(《감흥(感興)》 8수 중 제5)라고 했다.
즉, 이백은 청소년기에 학습 범위가 대단히 넓었으며 유가(儒家) 경전 외에도 고대 문사(文史)의 명저들 및 제자백가 책들을 두루 읽었다. 그는 또 “검술을 좋아했다.” 그는 아주 일찍부터 도(道)를 믿었고 산림에 은거해 신선을 추구하고 도(道)를 배우려 했다. 동시에 또 만년에 이르기까지 직접 공훈과 업적을 세우려는 정치적인 포부가 있었다.
이백은 청장년 시기 일찍이 고관대작들의 천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가고자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긴 했지만 충분한 정치적 능력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만년(晩年)의 이백은 마침내 자신의 인연을 투철히 보아내고 “예로부터 모든 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로다(古來萬事東流水)”라며 활달하게 노래했다.
검객 이태백
이백은 단지 시(詩)에만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검술(劍術)도 정통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총괄하면서 “검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고 몸에서 검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선화서보(宣和書譜)》에서는 “어려서 책에 통달했고 자라서는 검술을 좋아해 대범하게 구속받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어려서는 부친인 이객(李客)에게 검을 배워 15세 때 이미 뛰어난 검술을 연마했다. 《5월에 동로로 가며 상옹에게 답하다(五月東魯行答上翁)》에서 35세 때 “벼슬하지 못할 것을 알고 검을 배우러 산동(山東)에 왔네.”라고 했다.
이백은 또 여러 편의 시에서 자주 검을 언급했다. 그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검 뽑아 서리 나리는 달빛 밟으며
밤에 빈 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抽劍步霜月, 夜行空庭遍)“몸 일으켜 긴 칼 휘두르며 춤 추니
사방에 앉은 이들이 모두 우러러보네”
(起舞拂長劍, 四座皆揚眉)“긴 칼과 한 잔 술이면
남아의 마음 놓이나니”
(長劍一杯酒, 男兒放寸心)“차라리 검 털고 일어나
사막에서 뛰어난 공훈 세울지니”
(不然拂劍起, 沙漠收奇勳)
이를 통해 보자면 이백의 생활과 심령(心靈) 속에서 검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검은 도가(道家)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기(道器)이고 촉(蜀) 땅은 또 예부터 도가의 성지였다. 도를 구함은 응당 ‘적선(謫仙, 귀양온 신선 즉 이백)’이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백은 소년 시절부터 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다. 이백이 도인을 방문한 이야기는 《대천산 도사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다(訪戴天山道士不遇)》라는 시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일찍이 대천산(戴天山) 대명사(大明寺)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대천산은 지금의 사천 창륭현 북쪽이다.
당시 이백이 한번 산속에 있는 이 도사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대신 아름다운 오언 율시 한 수를 남겨 자신이 일찍이 도인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일을 남겨놓았다.
파란만장한 삶
이백은 또 청년 시기부터 끊임없이 외유(外遊)를 다녔다. 현종 개원 13년(725년) 24세의 이백은 촉을 떠났는데 “검을 메고 나라를 떠나 부모님께 작별하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仗劍去國, 辭親遠遊)”
이백이 청소년 시기 촉 땅에서 쓴 시가(詩歌) 중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이 아주 드문데 대표적인 것이 《대천산 도사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다(訪戴天山道士不遇)》와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로 이때부터 이미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42세 때, 이백은 당 현종(玄宗)의 부름을 받아 경성(京城, 지금의 서안인 장안)에 들어가 공봉한림(供奉翰林)이 되었다. 그러나 3년도 채 못 되어 장안을 떠나 하남, 산동 및 동남부 여러 지역을 떠돌았다. 현종 천보(天寶) 14년(755년) 안녹산의 반란이 일어날 당시 이백은 여산(廬山)에 은거하고 있었다.
756년 12월 이백은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기병한 영왕(永王) 이린(李璘, 역주: 현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의 막료로 초빙 받았다. 그러나 영왕이 부친을 대신해 제위에 오른 숙종을 분노하게 만들어 반역 혐의로 피살당한 후 이백 역시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얼마 후 당조(唐朝)의 전설적인 명장 곽자의(郭子儀)가 앞장서서 이백을 구명했고 결국 사형을 면한 이백은 야랑[夜郞, 지금의 귀주 동재현(桐梓縣) 일대]으로 유배를 떠난다. 숙종 건원(乾元) 2년인 759년 이백은 귀양가던 도중에 사면을 받았고 이때 나이가 이미 59세였다.
안사의 난은 8년이 지나서야 겨우 평정되었다. 《구당서(舊唐書)》 기록에 따르면 이백은 유배 가던 도중에 사면되었지만 도중에 지나친 음주로 숙종 보응(寶應) 원년(762년) 선성(宣城, 지금의 안휘성 선성현)에서 술에 취해 사망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이백은 만년에 금릉(金陵)과 선성 일대를 오갔으며 당도(當塗, 지금의 안휘성 당도현)에서 사망했다고도 한다. 어느 설을 따르든 이백은 향년 61세였다. (다음 호에 계속)
/정견망 명월(明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