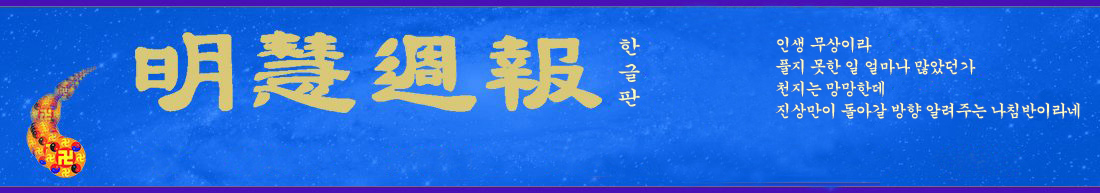송대(宋代) 시인 범중엄(范仲淹)의 시사(詩詞)는 문장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의 시 《월상문자규(越上聞子規)–월상에서 두견새 울음을 듣다》는 오언절구로 모두 20글자다.
밤이면 푸른 연기 속에서 울고
낮이면 나무 위를 날아다니네
봄 산이 제아무리 좋다 한들
오히려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네夜入翠煙啼
晝尋芳樹飛
春山無限好
猶道不如歸
밤이면 푸른 연기 속에서 울고
낮이면 나무 위를 날아다니네
전설에 따르면 두견새는 촉(蜀)의 황제 두우(杜宇)의 영혼이 변신한 것이라 한다. 늘 밤에 우는데 울음소리가 몹시 처량해서 고대에는 흔히 두견새 울음소리로 슬프고 처량하며 괴롭고 원통한 마음을 표현했다. 칠흑 같은 밤이면 두견새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낮이면 비로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가벼이 날아다니는 두견새의 이면에는 밤새 구슬프게 우는 슬픈 사연과 내원이 있기 마련이다. 마치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다.
봄 산이 제아무리 좋다 한들
오히려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네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 만약 고향을 멀리 떠나 있다면 집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며,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천상(天上) 고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익숙했던 곳 익숙했던 환경 익숙했던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이란 마치 하나의 여행과 같고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이다. 천상(天上)의 가족들이 모두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찌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련을 남기겠는가? 하물며 이곳의 아름다움이 또 어찌 천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인간 세상에서 봄날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고 인생에서도 봄날(가장 젊을 때)이 가장 아름다울 때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움도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영원히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그러면 오직 천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만이 생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봄 산이 제아무리 좋아도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세간이 제아무리 아름다워도 역시 인생에서 스쳐 가는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할 뿐이다.
글/ 섬섬(纖纖), 출처/ 정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