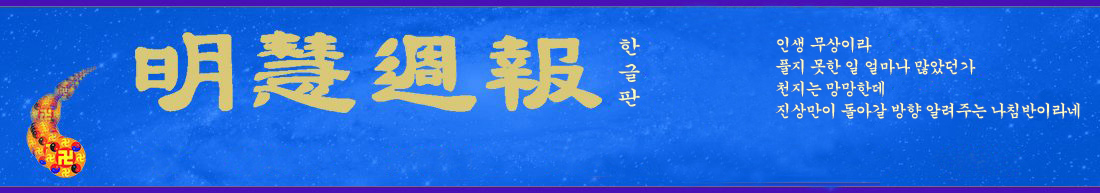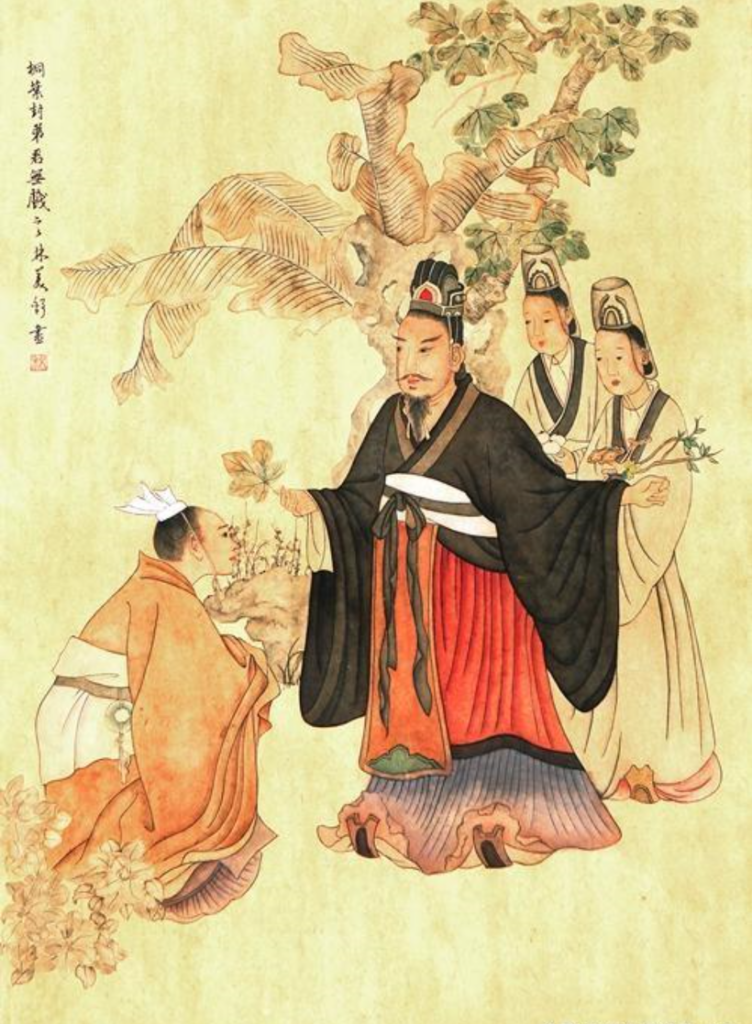
옛사람들은 예를 중히 여겼다. 공자는 “무릇 예라는 것은 선왕이 하늘의 도를 받들어 사람의 정을 다스린 것이다. 고로 예를 잃은 자는 죽고, 얻은 자는 산다.”라고 했다.
사람에게 예(禮)가 있으면 안전하고, 무례하면 위험하며, 도덕과 인의(仁義)는 예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예에 따라 행동하면 군신과 노소와 귀천에 질서가 있고, 사직이 안정되며, 국가가 흥성한다. 거꾸로 되면 기강이 무너지고, 인륜이 난잡해지며, 사회에 온갖 혼란이 나타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예를 인의(人義)라고도 한다. 즉,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공경하고, 동생은 공손하고, 남편은 의롭고, 아내는 순종하고, 윗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아랫사람은 복종하고, 군주는 인자하고, 신하는 충성하는 것이다.
주공이 부성애로 훈계하다
주(周)나라 문왕(文王) 희창(姬昌)의 넷째 아들 주공(周公)은 성이 희(姬), 이름은 단(旦)이었다. 그는 동생인 무왕(武王)을 도와 동쪽의 주왕(紂王)을 물리쳤고, 의례와 음악을 제정했다. 그는 유학(儒學)의 선구자로서 ‘원성(元聖)’으로 추앙받았다.
주공이 아들과 조카를 교육한 가훈으로 ‘계자백금(誡子伯禽)’과 ‘계질성왕(戒侄成王)’이 포함된 ‘희단가훈(姬旦家訓)’이 있다. 조조는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주공은 씹던 음식마저 뱉고서 손님을 맞이하였기에 천하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갔다”라며 집안을 다스리고 정무를 처리한 주공의 풍채와 도량을 찬양했다.
한번은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동생과 함께 나무 아래 서 있다가 오동잎 한 장을 동생에게 주며 “너에게 작위를 내리겠다.”라고 했다. 주공이 듣고는 성왕을 알현하며 말했다. “대왕께서 동생에게 작위를 내리시니 지극히 좋은 일이옵니다.” 성왕이 말했다. “짐은 농담을 한 것이오.” 주공이 엄숙하게 말했다. “군주는 그릇된 행동이 없어야 하고, 농담이 없어야 하며, 말은 반드시 행해야 하옵니다.” 뜻인즉, 군주는 언행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농담해서도 안 되며, 말을 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왕은 동생을 제후로 봉했다. 이것이 바로 ‘동엽봉제(桐葉封弟)’의 전고다.
성왕은 백금을 노공(魯公)으로 봉했다. 주공은 ‘계백금서(誡伯禽書)’에서 아들에게 예의를 지키라는 훈계를 다음과 같이 했다. “노(魯)나라를 받았다고 하여 인재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은 목욕하고 밥을 먹을 때도 스스로 태만하여 인재를 잃지 않았는지, 덕이 높고 사람을 공경하는 자가 영예를 얻게 했는지를 반성한다. 거대한 재부를 가지고도 근검하다면 위험이 없을 것이다. 지위가 높고 녹봉이 많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늘 부귀를 보전할 수 있다. 백성이 많고 군대가 강한데도 경외심을 품는다면 불패의 땅에 설 것이다. 총명과 예지를 갖추고도 교만하지 않다면 명철한 선비로다. 박식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데도 뽐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총명함이다.”
백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아주 빨리 노나라를 풍속이 순박하고 배움을 숭상하는 예의의 나라로 다스렸다.
효성 깊은 아들, 절개를 지키다
은(殷)나라 말기, 주(周)나라 태왕(太王)인 고공단부(古公亶父)에게 아들이 세 명 있었는데, 첫째는 희태백(姬泰伯), 둘째는 중옹(仲雍), 셋째는 계력(季歷)이었다. 계력이 희창(姬昌)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훗날 주나라 문왕(文王)이다. 희창이 태어날 때 대문 앞에 붉은 참새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부리에 단서(丹書, 짧은 글귀가 적힌 물건)를 물고 있었다. 태왕이 그런 상서로운 모습을 보고 왕위를 셋째 아들인 계력에게 주려 하자 계력은 다시 희창에게 넘겼다. 희태백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동생인 중옹과 함께 형만(荊蠻, 당시 야만족이 살던 양쯔강 이남 지역) 땅으로 달아나 머리를 자르고 문신까지 새겨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계력이 받은 왕위를 희창이 넘겨받으니 곧 주나라 문왕이다.
태백은 형만으로 달아나 스스로 구오(句吳)라고 불렀다. 형만의 백성 천여 가구가 주동적으로 그를 따랐고, 그를 오(吳)나라 군주로 옹립했다.
태백이 건국한 오나라가 명맥을 이어 제19대 국왕 수몽(壽夢)이 집권할 때였다. 수몽이 넷째 아들 계찰(季札)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계찰은 군자의 절개를 굳게 지키며 세 번이나 거절했다. 오나라 백성들이 계찰을 옹립하려는 생각을 꺾지 않자 계찰은 궁궐을 떠나 밭을 갈고 살았다.
공자는 태백이 천하를 극구 양보해 지극한 덕의 경지에 이르렀고, 스스로 공적을 감추어 백성들이 그를 찬양할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인자하고 원망하지 않는 ‘좋은 형’
‘가범(家范)’의 기록에 의하면 순(舜)의 부모와 동생은 늘 순을 살해할 방법을 찾았다. 순에게 곡식 창고를 수리하게 하고, 순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사다리를 치우고 창고에 불을 질렀다. 순은 아래로 도망쳤다. 그들은 또 순에게 우물을 치게 하고, 순이 우물 아래로 들어가자 흙으로 우물을 메웠다. 순은 옆으로 뚫린 구멍으로 나왔다. 순의 동생 상(象)은 순을 죽이려는 것이 모두 자기 생각이라며, 소와 양과 곡물 창고를 부모에게 주고, 방패와 창, 거문고, 활을 자신이 가지며, 두 형수에게 자신의 이부자리를 돌보게 하겠다고 했다.
상이 순의 방으로 들어가니 순은 침대에 앉아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상은 부끄러워하며 형님이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순이 말했다. “나는 신하와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 다스려라!”
순은 상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잘 알았는데, 왜 여전히 기뻐했을까? 맹자는 말했다. “소인배의 방법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있으나, 도의에 벗어난 속임수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다. 상이 형을 존경하며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으나, 순은 진심으로 그를 믿었고 그를 대신해 기뻐한 것이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효행을 근본으로 여겼고, 부모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면 곤란이 없다고 했다. 유독 순의 부모가 자애롭지 않았으나, 결국 순에게 감화되었다. 그래서 후에 세인들은 순을 큰 효자로 불렀다.
형을 따르는 동생
진(晉)나라 시기, 형제애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왕람(王覽)이다. 왕람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주(朱) 씨가 회초리로 형인 왕상(王祥)을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울면서 형을 끌어안았다. 왕람은 성장한 후에도 늘 어머니에게 행동을 신중히 할 것을 건의했다. 어머니는 매번 아주 많은 일을 왕상 부부에게 맡겼고, 왕람이 나서서 그들을 도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왕상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고, 어머니는 왕상을 더욱 증오해 독주로 그를 죽이려 했다. 왕람이 알고는 형과 함께 가서 독주를 빼앗았다. 주 씨는 왕람이 죽는 것을 걱정해 술을 빼앗아 부어버렸다. 이후 주 씨가 왕상에게 음식을 줄 때는 왕람이 먼저 맛을 보았다. 주 씨는 왕상을 죽이려는 생각을 더는 하지 않았다.
얼마 후, 형제가 모두 벼슬을 얻었다. 당시 여건(呂虔)은 국사를 보좌하는 왕상의 도량에 감동하여 허리에 차는 칼 한 자루를 왕상에게 주었다. 삼공(三公,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이 된 사람만 그 칼을 찰 수 있다고 했다. 왕상은 죽기 전에 칼을 아우인 왕람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의 후손이 반드시 번창해 족히 이 칼에 걸맞을 것이다.”
나중에 왕람의 여섯 아들은 각각 어사(御史), 무군장사(撫軍長史), 치서어사(治書御史), 상서랑(尙書郎), 중호군(中護軍), 국자제주(國子祭酒)로 임명되었고, 그중 무군장사 왕재(王裁)의 아들 왕도(王導)는 ‘진서(晉書)’에 특별히 기록(왕도전)되었다.
글/ 류이춘(劉一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