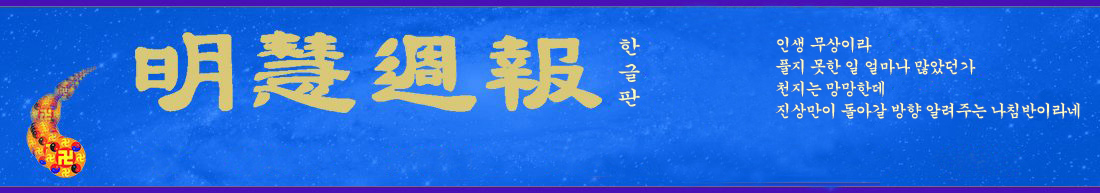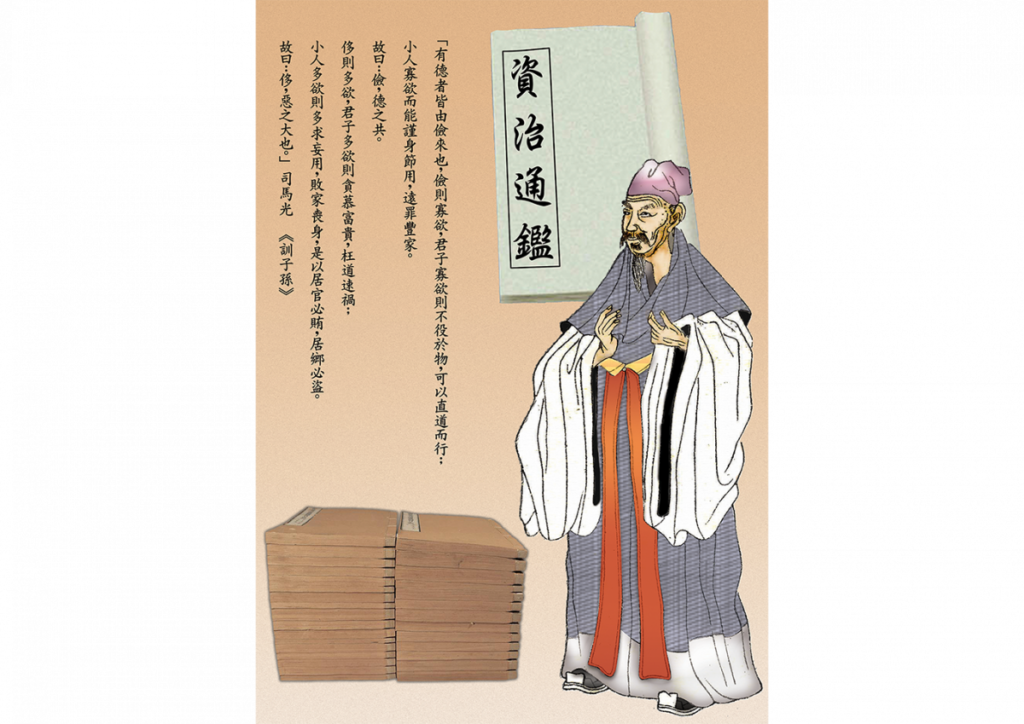
북송을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사학자인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資治通監)』 저자로 유명하다. 이 책은 전국시대부터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 오대십국 역사를 정리한 방대한 저작으로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서 중 하나로 꼽힌다.
숱한 역사적 기록을 담아낸 사마광의 일생 또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릴 때부터 진중하고 총명했던 사마광은 7세가 되던 어느 날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큰 물항아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잠겨버렸다. 다른 아이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빴으나, 사마광은 자신보다 훨씬 큰 항아리를 지켜보다가 옆에 있던 돌을 들어 항아리를 깨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석격옹(持石擊瓮)의 고사다.
사마광은 20세에 과거에 급제해 진사가 되었고, 1067년 신종(神宗) 원년에 한림학사가 되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신종이 왕안석(王安石)을 발탁해 신법(新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해 낙향했다. 그는 당시 통치에 귀감이 될 만한 수많은 역대 서적을 모아 편년체(編年體) 역사서인 자치통감 저술에 돌입했고, 신종도 책의 완성을 크게 기대해 그의 뜻대로 낙양에 살며 계속 책을 편집할 수 있게 도와줬다. 1084년 마침내 완성했다.
그가 편찬한 자치통감은 공자의 『춘추(春秋)』에 필적하는 편년체 역사서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역사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주로 유교적 도덕론의 관점에서 인물을 평가했다.
손톱으로 책장을 넘기지 말라
사마광은 일을 하거나 가정 생활에서 특히 자식들에게 사치를 경계하고 몸을 삼가며 근검절약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유몽(劉蒙)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자신을 일러 “땅을 본 후에야 움직이고 발을 구른 후에야 선다.”라고 말했다.
한번은 아들이 책을 읽을 때 손톱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을 본 사마광이 꾸짖으며 책을 아끼는 방법을 솔선수범해 알려주었다. 우선 책을 읽기 전에는 책상을 깨끗이 닦고 책상보로 덮는다. 또 책을 읽을 때는 단정하게 앉되 책장을 넘길 때는 우선 오른손 엄지 측면으로 페이지 끝을 들어 올린 후 검지로 가볍게 책장을 넘긴다.
역사서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울을 만들기 위해 그는 15년 동안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다. 늘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줄곧 작업에 몰두했다. 한번은 친한 벗이 찾아와 일을 좀 줄이라고 충고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선왕(先王)께서 말씀하시기를 살고 죽는 것은 명에 달려 있다 하셨네.” 그는 이렇게 생사에 초연한 자세로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했으며 그의 이런 기풍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일상생활 방면에서도 사마광은 근검하고 소박했다. 그는 아들인 사마강에게 근검절약에 대해 훈계한 문장인 『훈검시강(訓儉示康)』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평생 옷은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면 족하고 음식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족했다. 이는 내가 일부러 더럽고 해진 옷을 입어 세상 풍속을 바로 잡아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본성에 따라 행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은 모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오직 검소한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고집스럽고 고루(固陋)하다고 비웃지만 나는 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와 더불어 공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길 ‘근검절약하면서 과실을 범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셨다고 알려준다. 또한 ‘선비가 도에 뜻이 있으면서 나쁜 옷과 음식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는 더불어 논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선인들은 검약을 미덕으로 여기셨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검약을 병으로 여기니 이 어찌 괴상하지 않은가!”
그는 이처럼 아들에게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가서(家書)의 형식으로 문장을 썼으며 이 문장에서 당시 유행하던 사치스러운 풍속을 반대하고 근검하고 소박한 생활을 강조했다.
사치를 죄악으로 본 이유
첫째, 사치스러운 세상 풍속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사마광은 선인들은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절약을 비웃는데 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풍속이 더욱 퇴락해 겉치레를 좋아하고 잘 사는 티를 내는데 일반 병졸이 사대부의 옷을 입고 농부가 수놓은 신발을 신는다고 했다. 또 벗들을 모아 잔치를 준비하는데 몇 달 치 급료를 쓸 정도이다. 사마광은 이런 악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이런 풍속을 금지할 순 없을지라도 내 어찌 방조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한다.
둘째, 근검절약의 미덕을 제창했다. 사마광은 송나라 진종(眞宗)과 인종(仁宗) 시기 이항(李亢), 노종도(魯宗道), 장문절(張文節) 등 청렴한 관리들의 풍속을 찬양했다. 특히 아들에게 장문절의 말을 인용해, 검소함에서 사치로 들어가기는 쉽지만, 사치에서 검소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일깨워주었다.
이어서 그는 춘추시대 노나라의 대부 어손(御孫)의 말을 인용해 “검소함은 덕(德)과 함께 하는 것이며 사치는 죄악(惡)이 큰 것이다.”라고 했다. 또, 도덕과 검약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세히 해석해, “덕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검소함에서 유래한다. 무릇 검소하면 욕심이 적은 법이다. 군자가 욕심이 적으면 외물(外物)에 부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도로 행할 수 있다. 반면 소인이 욕심이 적다면 근신(謹身)하고 절약할 수 있어 죄를 짓지 않으며 집을 번창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사치하면 욕심이 많아지는데 군자가 욕심이 많으면 부귀를 탐하여 도에서 어긋나고 재앙을 부르게 되며 소인이 욕심이 많으면 많은 것을 구하여 함부로 사용하기에 패가망신하기 쉽다.”라고 했다.
셋째, 사마광은 아들에게 끊임없이 경계의 말을 했다. “독서는 진지해야 하며 일은 착실해야 하고 생활은 검소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 나라를 경영하는 큰일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가문이 흥하고 나라가 번영하는 기초가 된다. 바로 이런 도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수신(修身), 제가(齊家)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할 수 있다.”
“검소함에서 사치로 들어가기는 쉽지만, 사치에서 검소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경구는 지금은 이미 세인들이 익히 아는 유명한 말이 되었다. 사마광의 교육을 받은 아들 사마강(司馬康)은 어려서부터 검약(儉約)의 중요성을 알아 이로써 자신을 다스렸다. 그는 부친에 이어 진사에 급제했고 벼슬이 교서랑, 저작랑, 시강을 겸했으며 고금 역사에 두루 통했다. 이리하여 청렴결백하고 근검하며 소박한 명성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